도처에서 코로나19 이후 그동안의 흥청망청하던 잔치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미 이전에 많은 이들이 “과도한 소비로 특징지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방식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증언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시간에 닥쳐온 이 긴급한 사태는 우리가 서 있는 문명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그 사실을 아프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종교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의미에서는 ‘습관’과 무관하지 않은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생활에 익숙해질 거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각박하고 힘겨운 세태 속에서 정신적 피난처를 찾는 이들이 늘어날 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할 것인가? 부흥할 것인가?”도 물론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이 완전히 지나고 봄이 깊숙이 왔음을 알리는 원색으로 화려했던 꽃들이 다 떨어지고 가지마다 신록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은 아쉬움을 자아내지만, 그 자리에 맺히는 열매가 있을 것이니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그 열매는 현실이 어렵다고 하여 앙앙대지 말고 조용히 성숙을 모색하라고 이 여린 잎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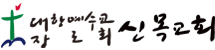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