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익숙한 사람 혹은 물건들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을 청하는 밤까지, 아니 잠이 든 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살아갑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비상시가 된 다음 비로소 그들의 존재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의 사람들이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당장 어쩔 줄 몰라 허둥댑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심히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삭막하게 만듭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밥을 먹는 자식에게’라는 시입니다. “천천히 십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여” 특히 마지막 구절이 무딘 가슴을 툭 칩니다. 단순하면서도 소박하지만 어떤 핵심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동안 당연히 여겨온 것들은 천천히 곱십으며 그 속에 스며있는 은혜와 감사의 맛을 먼저 누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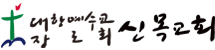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